
국제건설계약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률 사이의 거리감
국제건설계약은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관련 실무를 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부감이 드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륙법계(Civil Law)인데, 국제건설계약은 FIDIC 계약서와 같은 영미권 중심의 표준계약을 통해 보통법계(Common Law)인 영미법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르다고 해도 법이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나름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학과에 입학을 하면, 교수님들께서 강의시간에 종종 매사에 '법적 사고(Legal Mind)'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학부 기간 동안에 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부분만큼이나 Legal Mind를 체득하는 것이 나중에 실무를 하는 데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경우도 있었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뜬 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교수님은 앞으로 4년간의 학부 기간을 충실하게 보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Legal Mind가 형성될 것이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체계화될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Legal Mind라고 하면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사안마다 법률의 관점에서 원인, 과정, 결과를 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 지갑에 내게서 빌린 돈보다 많은 액수의 수표가 있다. 그러면 채권자인 나는 어떻게 할까? 만약, 채권자인 내가 피지컬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성질이 급하다면, 당장 채무자의 지갑을 낚아채서 수표를 빼앗아 버리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부터 다를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액수가 크다면 담보도 설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계약서를 쓰는 것이 곤란한 사이이거나 상황이라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빌려줬다는 근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을 것이다.
그 후에 채무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갚지 않는 가운데,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빼앗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률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강제로 수표를 빼앗을 경우에 오히려 강도죄 내지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채무자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안 나는 1) 채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처분을 고려할 것이고, 2)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및 법정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변제를 강제하고 채무 변제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영미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제건설계약은 무엇이 문제라서 대륙법계의 Legal Mind를 가진 사람에게 거부감이 든다는 것인가?
대륙법계에서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만큼이나 신의칙이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국제건설계약에서 적용되는 Time Bar, 나아가서 Time Bar를 준수하지 않은 Contractor에 대하여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를 가지는 Employer가 오히려 준공 지연에 대하여 Contractor에게 Liquidated Damages를 청구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신의칙에 명백하게 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륙법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사가 타절된 경우에 Employer가 Contractor의 설비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No Lien과 같이 Contractor의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계약조건들은 대륙법계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 책의 장점과 단점
이 책의 저자인 박기정 영국변호사는 국제건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하나씩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인용된 대부분의 사례는 FIDIC 양식을 따른 건설계약이었고, 그로 인해 FIDIC의 조항 해석과 이해에 대한 설명도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부분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각 분쟁 사례는 해당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책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준거법이나 관할에 따라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로 인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는 식의 조언은 다소 레토릭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영문을 한글로 해석한 부분들 중에 일부가 부자연스럽고, 영어로 쓰인 부분에 오류가 눈에 띈다. 특히 ‘~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with regard to를, 문법적으로 틀린 with regards to로 잘못 쓴 경우가 많아 눈에 띄었다.
현실적으로는 FIDIC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며, 각 프로젝트의 특수성과 당사자의 요구, 특히 계약 초안을 작성하는 측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Engineer와 Contractor, 혹은 Contractor와 Subcontractor 간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과거 갑을관계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쪽에 불리한 조건이 설정되기 쉽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사항이 견적금액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 진행 중에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 궁금했다. 책에서 이 부분이 일부 언급되기는 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
관심을 끌었던 내용들
이 책에서 다루는 다양한 리스크 중에서도 ‘Fitness for Purpose(목적 적합성)’ 의무에 관한 부분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는 하자 보증 기간(Warranty Period)이 종료되면 시공사가 발주처에 대해 부담하는 대부분의 의무도 종료되며, 최종 준공 확인서(Final Completion Certificate)가 발급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워런티 기간이 지난 후라도 ‘Fitness for Purpose’ 의무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설계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표준을 따랐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표준 자체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면, 이를 적용한 시공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인상적이었다. 실무적으로 보면 EPC 프로젝트에서 설계(Design)가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설계를 발주처가 외주를 통해 직접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Adverse Physical Conditions(불리한 물리적 조건)’ 관련 이슈도 흥미롭다. FIDIC 계약에서는 해당 조건이 예측 불가능(Unforeseeable) 한 경우, 시공사는 공사 기간 연장(Extension of Time)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공사가 ‘경험 있는 계약자(Experienced Contractor)’로서 해당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공사는 입찰 단계에서 이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기후 조건(Climate Conditions) 은 FIDIC 상에서는 Adverse Physical Conditions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불가항력(Force Majeure) 등 다른 조항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항을 유기적으로 검토하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으로 보인다.
'Read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춘문예 당선시집(2025) (0) | 2025.08.03 |
|---|---|
| <<잡문>> 안도현 雜文 (0) | 2025.07.28 |
| 고도를 기다리며 - 본질이 사라진 껍데기와 같은 일상의 공허함 (0) | 2025.07.22 |
| 있는 그대로 튀르키예 - 아는 듯 우리가 잘 모르는 튀르키예를 소개한 책 (0) | 2025.07.15 |
| 괭이부리말 아이들 - 흙탕물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이타심(利他心)과 연대(連帶) (0) | 2025.07.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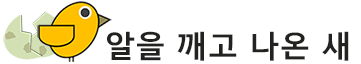




댓글